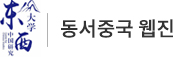사드 이후, 부산과 상하이의 협력 방안
사드로 인한 대한(對韓) 제재조치의 출구전략이 감지된다. 최근, 상하이 정부가 사드를 핑계로 봉쇄했던 한국 관광객 파견을 재개하겠단다. 물론 여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하이 시내에 적을 둔 3~4개 여행사에게 한국 단체관광객 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지난 시기까지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견지해 왔던 터라, 사드로 인한 제재조치는 우리의 경제, 산업, 문화교류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취약 구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배치된 사드로 인해 그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혀 하지 못했던 당시 정부의 탓도 크지만, 중국의 옹색한 배포도 문제라면 문제였을 터다. 오늘날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미간 무역전쟁의 씨가 그때부터 배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아무튼 한국은 지금까지 믿어 왔던 중국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한 건 사실이었다. 국제간 발생한 앙금이 아물기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질서와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슬그머니 먼저 빗장을 내리고 있다. 소프트 산업이라 할 관광에서부터 빗장을 풀어 내리는 국면을 맞아 우리 역시 새로운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관광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았다. 특히 부산의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대부분 해양크루즈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부산을 찾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57만여 명 중 중국인이 45만여 명으로 79%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사드 제재'가 본격화 되었던 2017년의 중국 크루즈 관광객은 6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바람에 전체 크루즈 관광객 수가 17만 여명에 그치고 말았었다.
-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사드 이전 중화권 크루즈관광객 모습
2017년 12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새로운 한중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사드 보복 전면 철회를 시사한 바 있었다. 그 후, 2018년 들어 벌써 두 번째 방한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도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공언했고, 그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는 듯하다. 이번에 상하이가 해금조치를 선언하게 되면서, 단체관광 재개 지역은 베이징시를 비롯해 산둥성, 후베이성, 충칭시 등 총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의 조처는 또 다른 상징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즉, 이웃한 저장성이나 장쑤성 등은 중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한국 단체관광 송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관광에 대한 가속도가 예견되고 있어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부산국제영화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이빙벨> 사건으로 파탄에 이르렀던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혁신은 물론 민선7기 시장의 출범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중국의 감독, 배우, 영화사 관계자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역시 사드보복의 일환이었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사업 전반이 엄격한 국가 통제하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정치권력의 자장력 속에서 맴도는 한 문화예술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다시 중국의 감독, 배우, 영화인들이 오기로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올 가을, 해운대를 누빌 중국 영화인들을 떠올리면 뜬금없이 내 발걸음이 바빠진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쌍방간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이,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가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할 중국의 일반 단체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보는 것은 어떨지?
-
사진출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B&R’s)”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일대(一帶)”는 육상경제벨트, 일로(一路)는 해상경제벨트로 고대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21세기적으로 재편한 신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는 3개의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 루트와 2개의 해양 실크로드 루트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각기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트해),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및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등 세 개의 육상 루트와, 중국 해안-남중국해-인도양-유럽 및 중국 해안-남중국해-남태평양 등 2개의 해양 실크로드 루트로 구성된다. 이들의 연선 국가는 도합 65개국에 이르며 이들을 하나로 엮어낼 구체적인 전략으로 “5통(五通)”의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5통은 즉, 정책구통(政策溝通 :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정책 소통의 플랫폼 구축), 시설련통(設施聯通 : 도로, 철로,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 혹은 물질적 네트워크 건설), 무역창통(貿易暢通 : 통관제도, AEO 인증제도, 무역 및 투자 편리화 등 초국경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제도적 연계), 자금융통(資金融通 : AIIB, 실크로드 기금과 같은 금융 및 융자 지원 플랫폼), 민심상통(民心相通 : 관광, 의료, 학술, 체육, 문화 등의 인적 교류)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들 지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엮어 내는 유력한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중에서도 필자가 늘 관심을 갖고 추적해 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 학술, 문화, 체육, 관광 등의 교류 협력 방식과 내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민심상통”이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영화를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 실로 그 성장 속도가 무섭다. 지난 6월 개막한 제21회 상하이국제영화제는 그러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차분하고도 다부진 모습으로 한해 두해 성장해 오는 동안 정치적 경향성이라는 울타리에 갖혔던 상하이 국제영화제는 분명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상하이국제영화제가 당당히 부활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문성과 권위성에 영화인들의 국제적 교류플랫폼으로서도 손색없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영화제로 급성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하이국제영화제가 시상하는 금작상(金爵奖)도 의미가 있지만,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일대일로 영화제연맹”을 창립하고 “일대일로 영화주간”, “일대일로 영화상영”, “일대일로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일대일로”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즉,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일대일로 영화제” 협력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 강력한 “인문교류”를 추진하면서 더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와 관련한 광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야망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야망에 걸맞게 이번 영화제에서 총 500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작상 공모 참가작만 하더라도 세계 108개 나라와 지역의 3,447편에 달했고, 그중 <프라이데이즈 차일드>, <해트트릭>, <홀 인 더 해드>, <로스트 파인드>등 13편의 영화가 입선했다. 이중에는 중국과 미국, 폴란드, 이란,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스위스와 몽골, 쿠바와 캐나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공동 제작한 영화도 있다. 가히 상하이국제영화제의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중국영화 박스오피스가 560억 위안에 육박한 2017년 들어 침체에서 도약으로의 골든크로스를 맞이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영화산업계가 콘텐츠 생산을 중시함에 따라, 처음으로 작품 수가 감소한 반면 퀄리티 향상 효과가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영화산업은 맹렬한 기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17년에 중국의 스크린 수는 이미 5만 개가 넘어 처음으로 북미를 제쳤다. 우리가 중국의 영화산업의 맹렬한 성장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영화자체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라는 광활한 소비시장과 날로 성장해 가고 있는 질높은 상품에 대한 욕구는 중국의 대중문화 소비관념을 변화시키면서 영화와 관련된 연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티켓 플랫폼을 넘어서, 동영상 플랫폼, 디지털화 미디어, 심지어 금융과 영화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산업은 이제 겨우 정치적 자장을 벗어나 정상화의 걸음을 딛고 있는 형편이라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과 상하이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으면서도 따지고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지역이다. 부산과 상하이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윈윈하기에는 아직은 거리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낯선 곳이기도 하다. 뛰거나 날고 있는 상하이에 비해 부산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막연한 처지다. 부산과 상하이의 진정한 상호협력은 어디서부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의문이다.